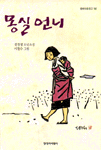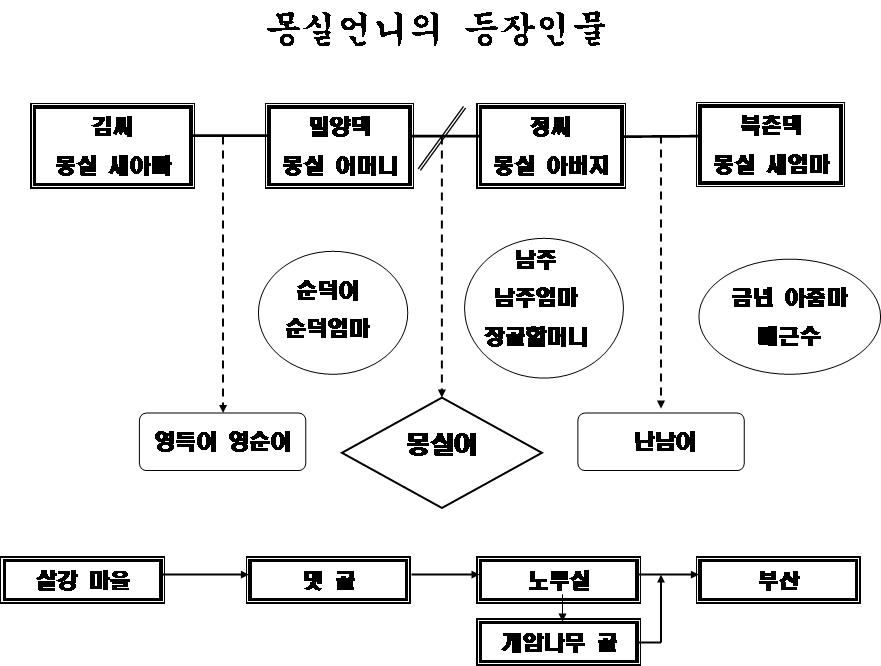몽실언니-권정생
책을 좀체 빨리 읽지 못하는 제가, 한자리에서 다 읽어버린 책입니다.
다 읽은 후에,
흥분을 감추지 못해 난데없이 친구에게 전화해 주절 주절 떠들었죠.
물론, 친구는 나의 뜸금없는 전화 내용에 어이없어 했습니다.
"용건이 그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말이죠.
사실, 어머니를 꼭 안아 드리고 나서, 읽어 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어찌도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 어머니, 아버지 생각이 그리 나는지…….
모 우유업체 광고처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를 하루 세 번 외치게 해주는 책입니다. ^^
고등학교 다닐 적 문학선생님께서 한국인을 설명하는 두 단어를
‘은근과 끈기’라고 말씀하셨는데, 몽실이가 딱 그렇습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더랬는데……..
흥분이 가라앉고 나니, 열말이 불필요 한 듯 합니다.
그래서, 책의 인용으로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고개 위에서 몽실은 밀양댁의 그 울음소리를 들었다. 눈자위가 씀벅거리고 코가 찡하게 더워왔다. 몽실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엄마 잘못이 아니야. 엄마 잘못이 아니야....." 입속에서 수없이 뇌며 몽실은 걸었다. 작은 보따리를 보듬어 안고 절뚝절뚝 고모의 뒤를 따라 부지런히 부지런히 걸었다.
".....그렇지 않아요. 빨갱이라도 아버지와 아들은 원수가 될 수 없어요. 나도 우리 아버지가 빨갱이가 되어 집을 나갔다면 역시 떡해드리고 닭을 잡아 드릴 거여요." "........." 정씨는 입을 꾹 다물었다. "내말이 맞죠?" 정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몽실은 잠자코 듣기만 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한번씩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꼭 벌을 받아 죽는다고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착한 사람도 죽는 건 마찬가지야. 새어머니는 너무너무 착했는데도 죽었어'
몽실은 일년 전에 이리로 올 때처럼 다시 난남이를 업고 김씨네 집을 나왔다. 밀양댁은 쌀을 한말 팔아 몰래 몽실의 품안에 그 돈을 넣어주었다. "몽실아, 에미를 원망해도 할말이 없구나." "엄마 원망 안해. 사람은 각자가 자기의 인생이 있다고 했어." 몽실은 전에 노루실 창고에서 가르쳐 주던 최선생 생각을 했다.
"에잇, 더러운 것!" 어떤 남자가 침을 뱉으며 발길로 찼다. 아기가 자지러지게 울었다. "안 되어요!" 몽실은 저도 모르게 몸을 아기쪽으로 가리고 섰다. "비켜! 이런 건 짓밟아 죽어야 해!" "화냥년의 새끼!"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제각기 침을 뱉고 발로 쓰레기 더미를 찼다. 몽실은 다급하게 아기를 덥석 보듬어 안았다. 강아지처럼 새까만 덩어리가 손에 말캉거리며 집혔다. . . . . . "그러지 말아요. 누구라도, 누구라도 배고프면 화냥년도 되고, 양공주도 되는 거여요."
http://lawcher.tistory.com2007-11-06T14:02:140.31010